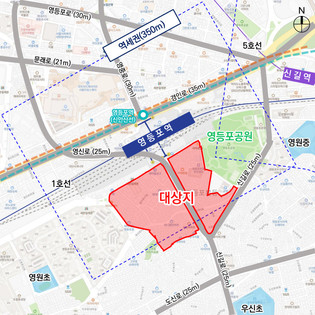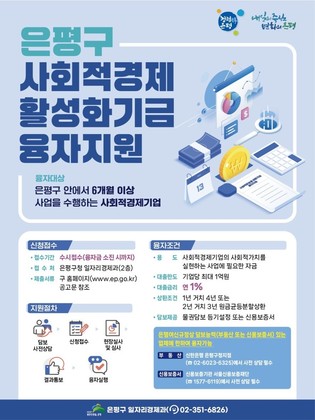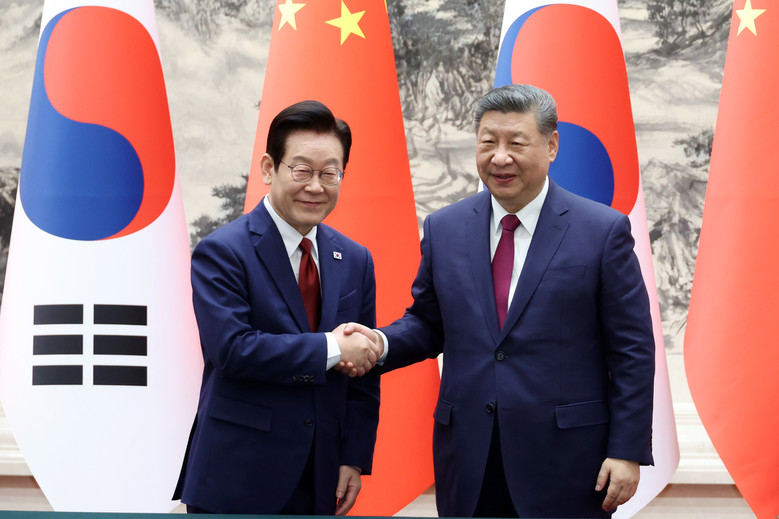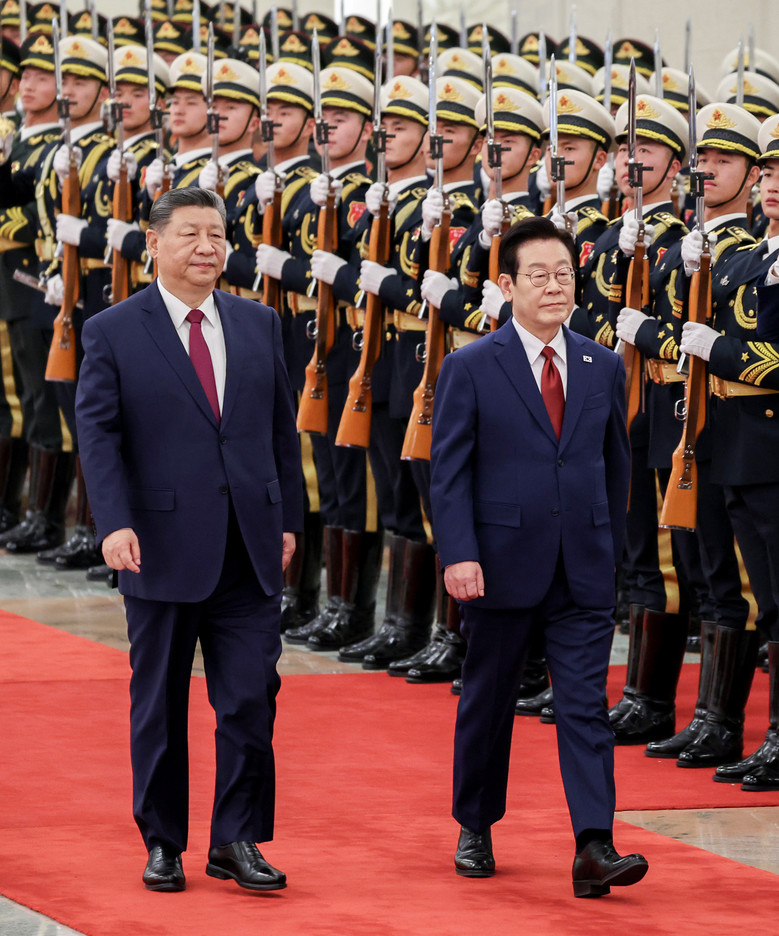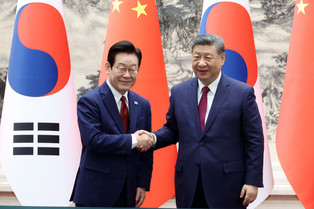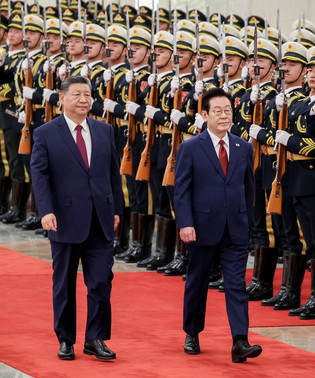|
| ▲ |
지난 3월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잠정치를 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8.52%로 2023년 말 6.55% 대비 1.9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015년 말 9.2% 이후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악성 비율은 11%에 육박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이 12.81%로 급등해 전체 연체율을 밀어 올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8.02% 대비 4.79%포인트 상승했다. 다행히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전년 말 5.01% 대비 0.48%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내수 진작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43조 원에 달해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속하는 내수 부진과 장기화하는 경기침체 속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2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 9,8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고 기록인 1월 말 잔액 42조 7,309억 원에서 불과 한 달 새 약 2,579억 원(0.6%↑)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 밖에 대환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 현금서비스 잔액 등도 소폭 늘었다. 지난 2월 말 기준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843억 원으로 전달인 1월 말 1조 6,110억 원 대비 730억 원(0.045%↑)이나 늘었고, 지난 2월 말 기준 현금서비스 잔액도 6조 7,440억 원으로 전달인 1월 말 6조 6,137억 원 대비 1,303억 원(0.02%↑) 증가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 역시 지난 2월 말 기준 7조 613억 원으로 전달인 1월 말 7조 522억 원 대비 소폭(91억 원↑) 확대됐다.
카드론은 특별한 심사 없이도 현금서비스 대비 비교적 장기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린다. 그만큼 상대적 금리가 높은 편이다. 개인 신용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카드 한도와 별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돈을 상대적으로 쉽게 빌릴 수 있지만, 개인 신용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금융서비스다. 대환대출은 통상 카드론 서비스를 받고 상환 기일 이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 다시 빌리는 서비스를 말하고, 리볼빙은 카드 이용금액(결제금액)의 일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결제를 이월시키는 서비스로 갚지 못한 부분만큼 이자가 붙는다. 따라서 대환대출과 리볼빙, 초단기 대출 상품인 현금서비스 모두 다 경제 사정이 넉넉지 못한 금융 취약 서민들이 이용하는 고금리 서비스다.
한편 지난 3월 19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하는 카드사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5%로 2023년 말 1.63% 대비 0.02%포인트 상승해 2014년(1.69%)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가장 높았다. 특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3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난 가운데 연체율이 3.38%에 달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서민층을 비롯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카드사 ‘급전 창구’로 몰린 결과다. 카드론,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연평균 14∼18%에 달해 부실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 문제는 계엄·탄핵 정국 장기화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제2금융권 연체 또한 위험수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비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교육비마저 감소할 정도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었다. 교육서비스업의 2025년 1월 카드 매출이 1조 7,400억 원으로, 2024년 1월 1조 8,500억 원 대비 5.5%나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매출에는 유치원, 정규교육 기관, 사설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등을 포함한다. 교육서비스업의 카드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시기이었던 2021년 1월 12.5% 감소한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다.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위 수준이다. 경쟁력도 떨어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매달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75.7%나 된다. 최근 3개월 새 폐업한 자영업자도 27만 명에 달한다. 대표적 내수 업종인 건설업은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연쇄 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지난해 4년 만에 2.3배나 늘었다. 2020년 72억 1,200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4년 188억 2,200만 원으로 161.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급자 역시 1,495명에서 3,490명으로 133.5%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2,500만 원으로 전년(3,100만 원)보다 19.4%(600만 원) 감소했다. 반면 부채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전년(1억 8,500만 원)보다 5.4%(1,000만 원↑) 늘었다. 뛰는 물가(올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와 높은 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 5대 시중은행 1월 평균 대출 금리 4.36%~4.88%) 부담에 소비심리 위축(한국은행 2월 소비자심리지수 95.2)까지 더해지고 심화하며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내밀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건설업계가 연이은 회생절차 신청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금융권이 보유한 건설업 ‘익스포져(Exposure │ 위험 노출액)’와 부동산 PF 익스포져의 합산 규모가 25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0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건설업 익스포져는 42조 2,000억 원·PF 익스포져는 210조 4,000억 원으로 집계돼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PF 익스포져 가운데 건설사의 신용 위험에 직접 노출된 금액은 27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이는 전체 PF 익스포져의 13%에 달한다. PF 부실이 본격화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건설업 불황이 심화하면서 금융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5년 1분기 동안 시공능력평가 300위 내 종합건설업체 중 12개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2024년 16건, 2023년 7건과 비교해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하면서 PF 사업의 분양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금융권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건설업 불황과 PF 부실이 맞물리고 겹치면서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추가적인 부실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건설업체 부실은 PF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대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권사와 캐피탈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PF 자산을 취급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소형 건설사 익스포져 비중이 64.7%에 달해 리스크가 더욱 크다. 게다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홈플러스 점포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홈플러스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향후 부지를 개발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 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설상가상(雪上加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R(Recession │ 경기침체)’의 공포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핵정국의 정치 혼란마저 장기화하고 있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총체적 복합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누란지위(累卵之危)의 경제 위기(危機)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와중에 이렇듯 제2금융권 부실이 심화하면 2003년 무분별한 카드 대출로 빚어진 ‘카드 대란’이나 2011년 PF 부실로 저축은행이 줄도산한 ‘저축은행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나락(奈落)에 선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빚에 짓눌린 서민 경제가 붕괴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서둘러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與)·야(野)·정(政)이 힘을 모아 높고 튼튼한 금융 방파제를 구축해야 할 때다. 또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거나 확산하지 않도록 약한 고리들을 촘촘히 점검하고 부채 총량을 줄여나가는 내핍(耐乏)과 고통 분담의 구조조정을 병행해 짙어지는 불황의 그림자를 거둬내야만 할 것이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