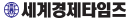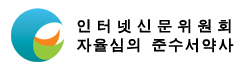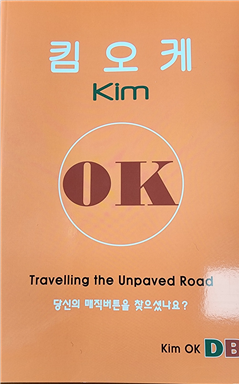
겨울의 밴쿠버는 오후 4시만 되면 캄캄해졌다. 나를 태운 버스가김씨네가 살고 있는 도시인 코퀴틀람에 도착하면 밤 11시쯤이 되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김씨네 집까지는 걸어가기가 불가능했다. 나는추위에 몸을 떨며 캄캄한 거리에 혼자 서서 김씨 차의 헤드라이트가 나를 비추기만을 기다렸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한밤중에 김씨네를 기다리던 내 마음은 구조를 바라는 에베레스트 산의 조난자와같았다. 마침내 김씨의 차에 오르면 나는 차 안의 훈훈한 공기에 내
몸이 스르르 녹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는 미안함도 잊은 채 곯아 떨어졌다.
김씨 부부의 아이들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 때까지자지 않고 있었다. 김씨 부부는 예쁜 세 딸을 두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서도 둘째는 특히 나를 잘 따랐다. 이들과 제대로 놀아 주지 못하고 나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느끼며 쓰러져 잠을 잤다.
다음날, 김씨 가족들과 교회에 갈 때까지 내 피곤은 풀리지 않았다. 예배 시간 중에도 나는 졸기 일쑤였고, 앞사람의 등에 대고 절을 해 대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일요일 오후는 번개같이 지나갔다. 다시 일하는 집으로 돌아가야하는 시간이 되면 김씨가 그곳까지 차로 바래다 주었다. 최씨 아주머니네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김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치 끌려가는 소를 보는 듯해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게 안쓰러워하면서도 김씨는 힘을 주었다.
“조금만 참아요.”
나는 차마 대문 안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김씨 앞에서 눈물을 자주 흘렸다.
나의 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15시간이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캐나다 노동자의 평균 노동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손님들이 내 지하실 방 옆에 붙은 가라오케룸에서 노래를 부르고노는 날이면 나는 잠을 자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해야 했다. 최씨 아주머니는 가끔 내게 말했다.
“미스 김은 청교도 같은 생활을 하네.”
그랬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당시 나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억센 황소처럼 일만 했다. 그곳은 어쩌면 내 인생의 투우장이었는지도모른다. 물론 나는 결코 그 같은 노동에 쓰러지지는 않았다. 나는 고생을 기꺼이 감수했고, 그것을 통해 무서운 극기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